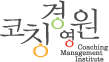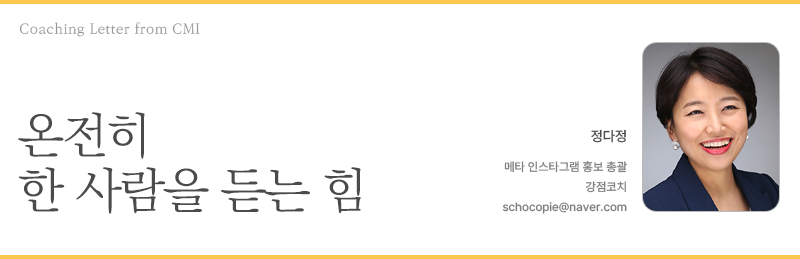 | ||
작년에 교수님의 권유로 법정언행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판사들이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를 관찰하고 코치로서 피드백을 해주는 프로젝트였다. 코칭을 위해 재판을 방청해 보니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더니 연락을 끊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녀를 고소한 사건, 수천만 원 카드빚을 갚지 않아서 카드사에 고소를 당한 사건, 외주를 맡긴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쌍방이 서로 고소를 한 사건 등 사건의 종류와 깊이는 끝이 없었다. 평소에 화가 나거나 분쟁이 생기면 속으로 고소하겠다고 쉽게 생각했는데, 고소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법정 분위기는 살벌했다. 재판 방청은 처음이지만 제3자인 내가 들어도 상황 이해가 된 것은 판사님의 태도 때문이었다. 방청하는 사람도 재판의 경과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전 사건을 요약하고, 꼼꼼하게 질문하고 경청을 하시는 모습이 돋보였다. 판사님은 소송관계인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다. “원고 대리인, 어느 정도 시간 필요하실까요?”, “3-4일 내로 제출하실 수 있을까요?” 같은 청유형의 질문이었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방식의 유연한 의사소통 방법이었다. 질문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화법이다. 또 주도권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판사님은 나 홀로 잘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되돌려주는 것을 잘하시는 분이었다. 본인이 이 사건의 쟁점들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인의 답변을 듣고 필요시에 요청하는 질문을 했다. 다음 기일을 위해 준비할 사항을 물어보면서 의뢰인이 중요한 증거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이해한 것을 되묻는 질문을 했다. 판사님은 관련 자료를 다 검토하고 그 관점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물었다. “저는 이렇게 들렸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자신의 주장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다. 제삼자가 듣기에 당황스러운 사건도 판사님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다. “피고는 말씀하신 이러한 원인 때문에 피고가 사용한 비용 OO만 원을 카드사에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신이 제출한 수백 장의 문서를 다 검토하고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돌려주는 판사님의 말에 피고는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다. 이 모든 과정을 고개를 숙이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소송관계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전달했다. 경청의 핵심은 바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듣는 것이다. 판사님은 귀로 듣고 눈으로 들었으며 태도로 본인이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방청 후, 직원들이 다 퇴근한 법원 사무실에서 판사님과 만났다. “법정에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위축되고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옵니다. 어쩌면 모두 색안경을 끼고 판사를 바라볼 수도 있죠. 판사가 냉정하고 쌀쌀맞게 보일수록 마음이 더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잘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역할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합니다. 여성의 강점을 살려 따뜻하게 배려해서 소송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하루에 50~70건의 재판을 하면서도 이런 존중과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기에 그것이 법정에서의 언행으로 드러나는구나 싶었다. 최근 들어 듣는 것의 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분, 생각, 태도를 모두 듣는 것이다. 한 사람이 제대로 들릴 때 그 사람은 불평하러 온 사람, 고발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항명하러 온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또 자신이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는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판결하는 판사가 나의 말을 들어주었다고 ‘인정’을 느낄 것이다. 경청은 사람을 살린다. ※본 글은 국민일보 혜윰노트에 게재된 글입니다. * 칼럼에 대한 회신은 schocopie@naver.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PREV [김종철] 전략은 나침반이다
-
NEXT [한근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